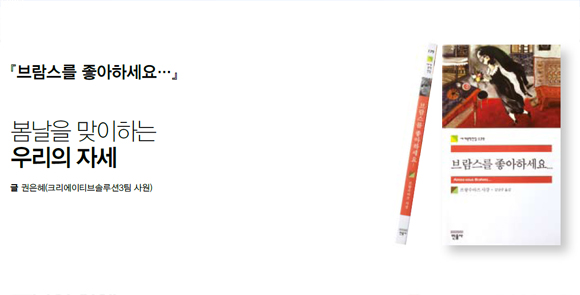
Guy에게,
바쁜 회사 속 여느 때와 비슷한 하루, 날이 따뜻해져도 딱히 별다른 즐거움이 없는 것 같아 조금은 슬플 때도 있지. 그런 일상 속에서도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함부로 덧없다고 가벼이 생각하지 않는 까닭은 뭘까? 그 모든 하루의 집합이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삶이기에, 어쩌면 삶의 전부일 수도 있기에 그런 것은 아닐까.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의 제목을 처음 읽었을 때, 어쩌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던 질문을 환기시키는 건 아닐까 생각했어. 절대 좋아해서는 안 될, 스승의 아내인 클라라 슈만을 깊이 사랑한 브람스. 너라면 그의 아름다운 음악을 떠나서 쉽사리 저 질문에 그렇다는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나 이외의 것, 내 생활 너머의 것을 좋아할 여유를 갖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난, 잘 모르겠어. 영원할 것만 같던 감정이 죽음처럼 끝나버릴 수 있음을 깨달았던 순간을 기억하니? 오직 스스로에게만 존재한다고 느낀 세계의 끝이 결코 자신만 겪는 게 아니라는 것,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알아버린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
주인공인 서른아홉 살의 폴은, 찬란하게 사랑했던 때를 이렇게 떠올려. 이미 그녀는 그 모든 것이 지속될 수 없으리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고. ‘그들은 마르크의 요트에 타고 있었다. 요트의 돛이 불안한 마음처럼 바람에 흔들렸다. 그녀는 스물다섯 살이었다. 문득 그녀는행복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모든 것이 잘되리라는 번개 같은 깨달음과 함께 자신의 삶 전체와 세상을 받아들였다. …그 이후에도 그녀는 다른 이들과 함께 혹은 다른 이들로 인해 행복감을 맛보았지만, 그렇게 전적으로, 그 무엇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방식으로 행복했던 것은 그 순간이 마지막이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이를테면 지켜지지 않은 약속에 대한 기억과 비슷했다.’
폴의 연인인 로제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결코 100% 충만한 감정은 아니었어. 하지만 젊은 시몽은 달라. 폴의 모든 것에 사랑과 신경을 쏟으며 세세한 그녀의 감정에 온전히 집중하려 애를 쓰지. 그러나 폴은 모든 충만한 감정의 덧없음을 알고 있어. 그리고 그녀는 믿음과 세월이 지배하는 세계로 한발 내딛지. 그녀에게 찾아온 시몽이 아닌 오랜 연인 로제를 선택하는 것으로. 책을 덮으며, 24세의 프랑수아즈 사강이 얄미워졌어. 미묘한 감정의 선을 이렇게 천박하지 않게 연주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음을 아니까. 세속적이지만 결코 치우치지 않는 폴의 감정선을 따라 읽노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차분해지더라. 그렇게 보면 사랑은,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흔한 싸구려 추억 일 수도 있어. 하지만 고이 보관한다면 영화 <타이타닉>의 잭과 로즈처럼, <운영전>의 운영과 김진사처럼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이별의 능력은 곧 사랑의 능력이 아닐까, 난 그렇게 믿어. 겨울이 오면 봄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